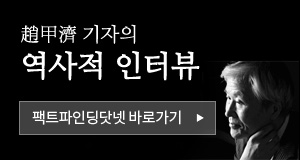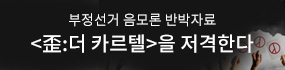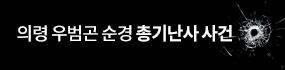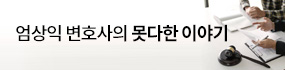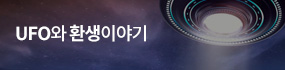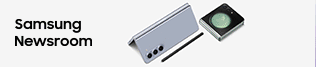조국을 잊은 지 오래인 국회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국방전문 大記者(대기자) 지브 시프氏의 충고-“외국군이 장기주둔하면 나라의 단합이 깨지고 국민의 정신력이 해이된다”는 말은 오랫동안 귓전에 남았다. 외국군 주둔의 정신적 폐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계층은 서민대중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이다. 생활에 바쁜 서민들은 관념과 위선에 잘 유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회는 조국을 잊은 지 오래이다. 북한 核문제 같은 민족의 死活(사활)이 걸린 사건을 해외토픽 보듯이 한다. 北核(북핵)문제에 대한 청문회도, 그 어떤 對北(대북)결의도 없었다. 국민세금이 40억 달러나 들어가게 돼 있는 對北경수로 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도 없었다. 對北쌀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회의 기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서 출발했다는 정치학의 원론도 모르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 그들에게 安保(안보)문제는 인기가 없는 曲目(곡목)이다. 한국, 이스라엘과 같은 전쟁下의 국가에서 정치의 제1주제는 안보문제여야 하며 정치행위는 그것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게 상식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안보란 본질적 國政(국정)문제를 美軍에게 맡겨버린 뒤 정권·당권·당선 같은 원초적 권력게임에 집착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정치의 低차원화, 저질화이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벌이는 이스라엘의 정치게임과 지역감정, 당파, 인맥, 권력에 눈치보기, 모함, 약점잡기 같은 키워드로 상징되는 한국의 정치는 그 수준과 성실성에서 이미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에서 접하는 신문·방송·잡지·책들도 온통 안보를 제1주제로 삼고 있었다. 이스라엘-시리아 평화협상의 조건을 둘러싼 격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戰死한 사건, 요르단 西岸(서안·West Bank)의 점령지에서 발생한 소요, 예루살렘의 아랍인 땅을 이스라엘 정부가 수용한 사건…. 텔 아비브의 서점에 갔더니 이차하크 라빈 총리와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의 자서전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노벨 평화상도 공동으로 받고 집권 여당(노동당)의 2大 지주이기도 한 두 사람은 30여 년간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 지금은 콤비가 되어 이스라엘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요르단, 시리아와의 평화협상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사람의 회고록은 이스라엘 정치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재미있게 읽혔다. 우선 두 회고록의 내용이 전쟁, 建國, 외교, 테러, 核개발, 비밀工作(공작)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낸다. 라빈, 페레스 모두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쓰고 있다. 정치인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특히 시몬 페레스는 자신이 그 책임자로 일했던 核무기 비밀 개발에 대해서 한 章(장)을 떼내어 자세하게 쓰고 있다.
이스라엘은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에 의한 수에즈 운하 국유화 사건 때 프랑스·영국과 합세하여 對이집트 작전에 가담한 것을 기회로 삼아 프랑스와 비밀核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프랑스 기술의 도움으로 네게브 사막에 재처리시설, 원자로 등 핵무기 개발 단지를 만든다. 이스라엘 建國의 아버지인 벤 구리온 총리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나 골다 메이어(뒤에 총리 역임) 등 반대자들도 만만치 않았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배짱
페레스는 회고록에서 이 核개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번도 ‘核무기 개발’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대신 ‘核무장 선택권’이란 의미이지만 사실상 핵개발을 뜻하는 ‘뉴클리어 옵션’(Nuclear Option)이란 용어를 썼다. 페레스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비밀核개발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돌파해야 했던 여러 난관들을 설명했다. 그중의 하나. 페레스 당시 국방차관이 1959년 아프리카의 세네갈을 방문하고 있는데 벤 구리온 총리로부터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하라는 연락이 왔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줄 알고 돌아오니 벤 구리온 총리, 골다 메이어 장관,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 책임자 하렐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총리의 설명인즉, 소련의 첩보위성이 네게브 사막의 核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촬영했고 이 사진을 갖고 그로미코 소련 외무장관이 지금 워싱턴으로 날아갔다는 것이다. 포스터 덜레스 美 국무장관에게 그 사진을 들이대고서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 대해 核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으려 하는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특사를 미국으로 보내 간청을 해보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페레스가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리 이실직고하면 약점을 잡히게 된다. 그냥 가만히 있자. 도대체 소련 첩보위성이 찍은 사진에 뭐가 나오나. 땅을 판 구멍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딱 잡아떼면 그만이다.”
이런 취지의 설득이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核개발을 계속 추진해 지금은 核강대국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미 1960년대에 核폭탄 제조에 성공했고 지금은 약 400개의 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을 운반할 장거리 미사일 제리코 1, 제리코 2호도 實戰用으로 배치된 지 오래이다. 小國이 강대국의 감시망 속에서 비밀리에 核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核무기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국제적인 압력으로 경제난에 봉착, 결국 核무기 제조는 보류하고 있는 인도를 비롯, 박정희의 좌절과 북한의 경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스라엘이 유독 核무장에 성공한 것은 벤 구리온과 페레스 같은 배짱 있는 정치인의 리더십과 自主국방에 대한 정치권의 全面的(전면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한국처럼 美軍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었다면 核개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安保를 정치의 제1주제로 삼아야 정치수준 향상
1970년대 韓美국방장관 회담 때 럼즈펠드 美 국방장관은 徐鐘喆(서종철) 한국 국방장관에게, “만약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한다면 미국은 韓美 상호 방위조약의 폐기를 포함한 외교·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양국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고 통보한 적이 있다. 박정희의 核개발 등 자주국방 의지에 대하여 미국 편에 서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바로 金載圭(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이었음은, 그의 항소이유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카터 행정부가, 自主국방 노선을 추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朴正熙에 대해서 한국內의 일부 在野 및 정치 세력을 조종하고 人權외교라는 위선적 명분론을 들고 나와 코너로 몰았던 것도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시프 記者가 지적했듯이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 한국처럼 식민지 근성이 남아 있는 나라에선 外勢에 조종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된다. 조국 배신과 國論분열이 빈발하여 먼저 내부적으로 국가의지가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다. 페레스가 보인 배짱은 국내적으로 단합된 主權국가만이 부릴 수 있는 오기이다.
페레스와 라빈의 회고록에는 서로를 비판하는 대목이 수십 군데나 된다. 엔테베 작전을 설명할 때 페레스는 라빈 총리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라빈 총리는 국방장관이던 페레스는 자신이 지시를 하기 전에는 군사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더라고 폭로했다. 亂中日記(난중일기)에서 李舜臣(이순신)이 元均(원균)을 여러 번 비난하고 있는 것을 연상시킨다. 페레스와 라빈이 이런 글을 써놓고 어떻게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그런데도 두 라이벌은 지금 환상의 콤비가 되어 평화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의회에서의 격렬한 토론은 우리 국회를 무색케 할 정도라고 한다. 그렇지만 安保라는 큰 테두리에 대해서는 이견과 감정을 접어두고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정치 풍토이기도 하다. 安保라는 큰 주제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아무리 정쟁이 치열해도 國基(국기)를 흔들지는 않는다.
國軍엔 장군이 없다?
한국 정치의 저질화는 정치의 본질인 국가의 생존에 관련된 사안을 멀리한 당연한 귀결이다. 정치인의 크기는 그가 다루는 사안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볼 때 安保를 정치의 주제로 끌어안지 않는 한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선 ‘정치가’(Statesman)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한국의 安保문제를 남의 나라 문제 보듯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安保를 미국이 책임져 주겠지’ 하는 요행심과 의타심 때문이다. 한국군 지휘부도 마찬가지이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과 對北전략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한미연합사 사령관(駐韓미군 사령관)에게 전쟁수행의 임무를 맡겨놓고 그들은 자신의 직위를 즐기고 있다. 한국군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저는 한국군 중에서 장군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장군이 뭡니까. 전쟁에 관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 깊은 군사 지식과 리더십을 배양해야 하고 눈만 뜨면 전쟁에 관해서 공부·훈련·대비하는 사람이 장군인데 그런 사람 없어요. 반면에 주한미군의 지휘관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스스로를 연마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특히 駐韓미군 사령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한국을 방어하라는 것이므로 과연 그 임무를 수행할 만한 무기체제가 돼 있는지, 군의 士氣는 충분한지 그야말로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니 한국과 미군 장성들끼리 만나 이야기하면 10분 이상 대화가 안 돼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좌 같다니까요.”
기자도 직업상 韓美 양국군의 간부들을 많이 만나 보았다. 한국군 장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豪氣 또는 으스댐이다. 북한 인민군에 대한 과잉자신감까지도 감지된다. 그런 자신감에 걸맞은 전문지식과 군인의 자세를 발견하기란 참으로 어려웠다. 金泳三(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엔 그런 호기도 ‘주눅’으로 바뀐 것 같다. 언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군인만큼 추한 모습은 달리 없다. 우리 군의 主敵(주적)은 분명 북한 인민군이다. 한국군은 불행히도 1 對 1의 단독 결전으로써 인민군을 굴복시킨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방목표를 ‘적의 침략’에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金泳三 정부의 脫냉전 주장에 영합하려는 몸짓으로 보였다. 인민군에 대한 필승전략을 짜기도 힘이 부치는 판인데 통일 이후의 군사전략을 구상한다면서 日本을 가상적으로 설정한 문서가 공개되고, 全方位 방어 작전에 필요하다면서 사치스러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려는가 하면, 급기야는 좌파 수정주의적 史觀(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6·25 포스터까지 등장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나타난 한국군 지휘부의 이런 타락상은 대한민국이 또 다시 李氏朝鮮(이씨조선)의 文官(문관) 우위文化(문화) 속의 문약한 국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조국을 저주하는 사람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이후 文民이란 왜색용어를 내세우면서 지난 50년간 한국인들이 피·땀·눈물로써 쌓아올렸던 역사·국가·군사전통을 약화시키는 행태를 보여 왔다. 金泳三 정부는 그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내부의 敵’이니 守舊세력으로까지 표현하여 국가의 단합을 약화시키는가 하면(文民이란 말이 벌써 서민과 군인을 배제함으로써 분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文民정부’는 마땅히 ‘국민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내부의 敵’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외부의 敵’에 대해서는 비굴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인의 정의감을 망가뜨렸다.
1995년 6·27선거에서 보수·중산층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金대통령의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역사관과 국가관이 우리 현대사회의 성취와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金대통령은 1994년 부친에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5000년 썩은 나라를 바로잡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가와 역사의 大統(대통)을 이어가는 대통령이 자기 조상의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비방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金대통령의 정치적 代父(대부)인 故(고) 張澤相(장택상)씨의 회고록에 따르면 李承晩은 한 번도 “조선사람이니까 안 돼”식의 자학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승만에게 있어서 한국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무조건적인 헌신·충성·애정의 대상이었다는 의미이다. 金대통령의 말대로 5000년 동안 썩은 나라였다면 오늘날 GNP 세계 12위의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 된다.
5000년 동안 썩었던 것은 위선적인 명분론으로 백성을 착취하고 국가의 야성을 거세함으로써 자주·자위·자립의지를 말살했던 지배층-양반, 즉 文民들이었다. 金대통령의 이른바 文民정부가 역사의 停滯와 亡國(망국)을 가져왔던 그런 文民의 전통으로 이 나라를 회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
거의 공개적으로 核개발한 이스라엘의 배짱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0-12-0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