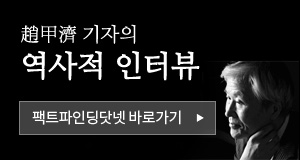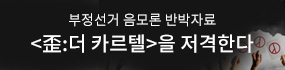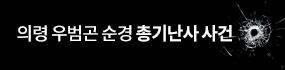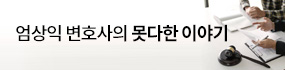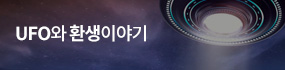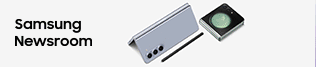신장 163cm의 비밀
박정희의 신장은 크지 않았다. 대통령 재임 중 작성된 그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신장이 163cm로 기록되어 있다. 박정희의 키가 작은 이유는, 모친 백남의가 박정희를 유산시키려고 임신기간 중 갖은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릴 적 그의 집안이 가난해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발육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모친 백남의 씨는 막내 朴正熙에 대해 유달리 사랑을 쏟았는데 그런 미안함에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
| 박정희가 쓴 '나의 소년 시절'의 첫 장. |
<우리 형제들이 다들 체구가 건장하고 신장도 큰 편인데 나만이 가장 체구가 작은 것은 이 보통학교 시절에 원거리 통학으로 신체발육에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의 소년 시절》 中
朴正熙는 유년 시절에 잦은 滯症(체증)을 앓았다. 소화제도 없던 시절이라 그는 침장이에게 침을 맞으러 다녔다고 한다.
<학교에 가지고 간 도시락이 겨울에는 얼어서 찬밥을 먹으면 나는 흔히 체해서 가끔은 음식을 토하기도 하고 체하면 때로는 아침밥을 먹지 않고 가기도 했다. 이럴 때는 하루 종일 어머니는 걱정을 하신다. 그러나 그 당시 시골에는 소화제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면 이웃집의 침장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침을 맞았다. 이상하게도 그 침을 맞으면 체증이 낫는 것 같았다. 나의 왼손 엄지손가락 뿌리에는 지금도 침을 맞은 자국이 남아서 빨갛게 반점이 남아 있다. 이 반점을 보면 지금도 어머니 생각과 이웃집 침장이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나의 소년 시절》 中
 |
| 박정희 부친 박성빈 |
어린 朴正熙의 엄지손가락 뿌리에 침을 놓아 준 침장이 할아버지는 바로 박정희의 아버지 박성빈의 둘도 없는 술친구 김병태였다. 그는 漢學(한학)에 조예가 깊어 동네에서는 漢學者로 알려져 있었다. 박성빈과 함께 아랫마을 ‘밤마’의 주막에 앉아 함께 漢詩(한시)를 짓고 唱(창)을 즐겼으며 침술에도 능했다. 선산 金 씨인 김병태의 손자뻘 되는 김재학 씨의 증언에 따르면, “동네 사람들은 응급조치를 대부분 김병태의 침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그의 집은 박정희의 생가 바로 아래에 자리했으나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로 변하고 말았다. 박정희가 말하는 엄지손가락 뿌리의 침 자국은, 엄지와 검지가 갈라지는 부분으로 合谷(합곡)이라 말하는 유명한 體針(체침) 자리다.
아버지 박성빈의 키가 대략 170cm 정도였고, 셋째 아들 박상희가 그보다 약 10cm가 더 컸다고 하니 박정희의 집안 사람들은 기골이 크다고 할 만하다. 朴正熙는 청와대에서 가끔 “내가 그때 하루 40리 길을 걸으면서 얼어붙은 도시락을 먹고 자주 체하곤 했으니 키가 이렇게 될 수밖에…”라고 말하곤 했었다.
비름나물
朴正熙의 집안은 가난했다. 제대로 된 끼니를 먹는 게 쉽지 않았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비름나물을 즐겨먹었다. 비름나물과 관련된 逸話(일화) 한 토막이 그가 쓴 《나의 소년 시절》에 실려있다.
<어느 늦봄 날이었다. 보통학교 2∼3학년 시절이라고 기억이 난다. 20里 시골길을 왕복하니 배도 고프고 봄날이라 노곤하기 그지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정오가 훨씬 넘었다. 삽작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혼자서 커다란 바가지에 나물에 밥을 비벼서 드시다가 “이제 오느냐. 배가 얼마나 고프겠느냐”하시며 부엌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기에 부엌에 책보를 든 채 들어가 보니 어머니께서는 바가지에 비름나물을 비벼서 막 드시려다가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같이 먹지 않겠느냐고 하시기에 같이 먹었다. 점심 때가 훨씬 넘었으니 시장도 하지만 보리가 절반 이상 섞인 밥에 비름나물과 참기름을 넣고 비빈 맛은 잊을 수가 없는 별미다.
나는 요즈음도 가끔 內子(내자)에게 부탁하여 비름나물을 사다가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 보곤 한다. 엄동의 추운 겨울에는 저녁을 먹고 나면 가족들이 한 방에 모인다. 세상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아버지와 형들이 한방에 모여 있으니 아버지가 계신고로 형들은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눈치를 알아차리시고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내려가신다. 형들에게 담배를 마음대로 피우도록 자리를 비워주시는 셈이다. 밤이 늦어지면 이야기도 한물 가고 모두들 밤참 생각이 난다. 어머니께서 홍시나 곶감을 내어놓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저녁에 먹다 남은 밥에다가 지하에 묻어둔 배추김치를 가져와서 김치를 손으로 찢어서 밥에 걸쳐서 먹기도 한다. 이것이 시골 농촌의 겨울밤의 간식이다. 가끔은 묵을 내오는 때도 있다.>
 |
| 박정희가 쓰던 앉은뱅이 책상. 셋째 형 박상희가 쓰 던 것을 물려 받은 것이라고 한다(현재 박정희 生家 에 보존) |
朴正熙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비름나물을 즐겨먹었다. 비름나물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에서 구할 수 없었다. 당시 청와대의 朴鶴奉(박학봉) 부속실장과 李光炯(이광형) 부관은 할 수 없이 씨앗을 사 가지고 와 청와대 본관 뒷동산에 작은 밭을 일구고 심었다. 李 부관은 미끈미끈한 비름나물이 맛이 없었으나, 朴正熙는 고추장과 참기름을 보리 섞인 쌀밥에 비벼 다른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맛있게 먹었다. 朴正熙의 측근들은, 그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비름나물 비빔밥을 먹는 것 같았다고 한다.
 |
| 박정희 생가 옆으로 풀짐을 나르는 큰형 朴東熙의 모습. 사진 우측에 살짝 보이는 방문이 박정희가 쓰던 공부방이다. |
나의 소년시절 (全文)
편집자주: 이 글은, 청와대 출입기자였다가 대통령 공보비서관이 된 金鐘信(김종신) 씨의 요청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회상해 1970년 4월26일, 직접 쓴 글이다. 박정희의 유년시절 일화, 가족관계, 집안 형편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가족관계
나는 1917년 음력 9월30일(양력으로는 11월14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동에서 태어났다. 당시 아버지는 46세, 어머니는 45세였으며 7남매 5형제의 막내둥이로 태어났다. 가족상황은 아래와 같다.
부친 박성빈(46세), 모친 백남의(45세), 장남 박동희(22세), 2남 박무희, 장녀 진실누님(귀희), 3남 박상희, 4남 박한생, 2녀 박재희(순희) 5남 박정희.
내가 날 당시 伯兄(백형) 동희 씨는 22세였고, 그 아래로는 대략 3~4세 터울이었다. 이때 위로 두 형은 결혼하고, 큰 누님은 칠곡 殷(은) 씨 문중으로 출가하여 내가 나던 같은 해에 딸을 낳았다. 어머니께서는 만산에 딸과 같은 해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매우 쑥스러워하셨다고 하며, 나를 낳으면 이불에 싸서 부엌에 갖다 버리려고 했다고 가끔 농담을 하셨다.
내가 태어난 상모동이란 마을은 원래 이곳 사람이 모래실이라고 불러왔다. 이 곳은 우리 외가 수원 백씨들이 대대로 살아왔는데, 조선조 초엽 수양대군이 조카 端宗(단종·조선 6대 임금)을 폐위시키고 찬탈을 했을 때 벼슬을 버리고 이 고장에 내려와서 살면서 단종을 사모하는 뜻에서 慕魯谷[모로곡: 魯山君(노산대군·단종은 君으로 강등됨)을 사모한다는 뜻]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는 어릴 때 약목에 계시는 외조부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상모동이란 마을은 191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을 그대로 상징하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선산 김 씨 數戶(수호)가 그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축이었고, 기타는 거의가 한량없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90여 호가 6개 小(소)부락군으로 나누어서 옹기종기 모여살고 있었다.
‘好酒家’ 박성빈
우리 집은 원래 조부 대까지 성주 철산이란 고장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약목 수원 백씨 문중으로 장가 와서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된 후 약목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약목에서도 여러 곳에 이사를 다녔던 모양인데, 어릴 때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친께서는 少時(소시)에 무과 과거에 합격하여 效力副尉(효력부위)라는 벼슬까지 받은 바 있으나, 원래 성격이 호방한데다가 당시 조선조 말엽 척도정치와 부패정치에 환멸도 느끼고 반항도 하여, 20대에는 동학혁명에도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처형 직전에 천운으로 사면되어 구명을 하였다고 한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아버지가 처형되었더라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옛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 이야기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고 또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했다. 동학란이 1895년경이니까 선친께서 나이가 22~23세 경이라고 짐작이 된다.
그 후부터 선친께서는 가사에 관심이 적고 好酒(호주)로 소일하면서 이래저래 가산도 거의 탕진을 하게 되니 가세가 나날이 기울어지고, 하는 수 없이 외가의 선산인 상모동의 位土(위토)를 소작하기로 외가의 양해를 얻어 상모동으로 솔가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해가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 해인 1916년이다. 지금 상모동에 있는 집은 그 당시 아버지가 손수 형님들과 같이 흙벽돌로 지었다고 한다. 이 집은 6·25 전쟁 당시까지도 옛 모습으로 복구하고, 안채는 초가로 가건물을 백형이 지었다가 5·16 후 지금 있는 안채를 다시 건립하였다.
지금 있는 사랑채 큰방은 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고고의 소리를 내며 태어난 산실이다. 상모동에 와서는 약 1600평 정도의 외가의 위토를 소작하면서 근근이 糧道(양도)는 유지가 되고, 형들이 성장하여 농사를 돕게 되니 생계는 약간씩 나아졌다. 아버지는 거의 가사에 무관심하고 출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어머니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어머니는 어려서 양가의 규수로 태어나서 출가 전까지는 고생이라고는 별로 모르고 자랐으나 출가 후는 계속된 고생 속에서 우리 형제 7남매를 남 못지않게 키우시느라고 모든 것을 바치셨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는 나의 셋째 형 상희 씨를 구미보통학교에 입학시켜 공부를 시키셨다. 그 당시 이 마을에서 보통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상희 형 하나뿐이었다. 내 나이 9세가 되던 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구미보통학교에 입학시켰다.
학교 가는 길
이때 형은 벌써 졸업을 했다. 우리 동리에서는 3명이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다. 다른 두 아이는 나보다도 나이가 몇 살 위이고, 입학 전에 교회에 다니면서 신학을 약간 공부한 실력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3학년에 입학하고 나는 1학년에 입학을 했다. 상모동에서 구미읍까지는 약 8km, 시골서는 20리 길이라고 불렀다. 1926년 4월1일이라고 기억한다.
오전에 4시간 수업을 했으니까 학교 수업 개시가 8시라고 기억한다. 20리 길을 새벽에 일어나서 8시까지 지각하지 않고 시간에 대기는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시간이 좀 늦다고 생각되면 구보로 20里를 거의 뛰어야 했다. 동리에 시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시간을 알 도리가 없고, 다만 가다가 매일 도중에서 만나는 우편배달부를 오늘은 여기서 만났으니 늦다 빠르다 하고 짐작으로 시간을 판단한다.
또 하나는 경부선을 다니는 기차를 만나는 지점에 따라 시간이 빠르고 늦다는 것을 짐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끔 기차 다이어가 변경되면 엉뚱한 착오를 낼 때도 있다. 그러나 봄과 가을은 연도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상쾌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여름과 겨울은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책가방을 허리에 동여매고 삿갓을 쓰고 간다. 아랫도리 바지는 둥둥 걷어 올려야 한다. 학교에 가면 책보의 책이 거의 비에 젖어 있다. 겨울에는 솜바지 저고리에 솜버선을 신고 두루마기를 입고 목도리와 귀걸이를 하고 눈만 빠꼼하게 내놓고 간다. 땅바닥이 얼어서 빙판이 되면 열두 번도 더 넘어진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면 앞을 볼 수가 없다. 시골 논두렁길은 눈이 많이 오고 눈보라가 치면 길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한다.
사곡동 뒤 솔밭길은 나무가 우거지고 가끔 늑대가 나온다 해서 혼자서는 다니지를 못했다. 어느 눈보라가 치는 아침에 이곳을 지나다가 눈 위에서 늑대 두 마리가 서로 희롱하는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어, 마을아이 셋이 집으로 되돌아오고 학교를 가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그곳을 지날 때는 언제든지 늑대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눈이 동그랗게 되어서 서로 아무 말도 않고 앞만 보고 빨리 빨리 지나가곤 했다. 그런데 이 솔밭이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나무 한 그루 없이 싹 벌목을 하여 뻘건 벌거숭이산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
그러나 학교 다니는 나보다도 더 고생을 하는 분이 어머니다. 시계도 없이 새벽 창살을 보시고 일어나서 새벽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다음에 나를 깨우신다. 겨울에 추울 때는 세숫대야에 더운 물을 방안에까지 들고 와서 아직 잠도 덜 깬 나를 세수를 시켜주시고 밥을 먹여 주신다. 눈도 덜 떨어졌는데 밥이 먹힐 리 없다. 밥을 먹지 않는다고 어머니한테서 꾸지람을 여러 번 들었다.
아침밥을 먹고 있으면 같은 동네의 꼬마 친구들이 삽짝 곁에 와서 가자고 부른다. 어머니는 같이 가게 하기 위하여 그 애들을 방안으로 불러들여 구들목에 앉히고 손발을 녹이도록 권하신다. 밥을 먹고 채비를 차리고 나면 셋이 같이 새벽길을 떠난다. 아직 이웃집에서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새벽길을, 얼어붙은 시골길을 미끄러져가며 뛰어간다.
망태골 밭두렁 길을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청녕둑(집 앞에 있는 산 이름) 소나무 사이에 우리들을 보내놓고 애처로워서 지켜보고 서 계시는 어머니의 흰옷 입은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도 어머니께서는 늘 그 장소에 나와 계시거나, 더 늦을 때는 동네 어귀 훨씬 밖에까지 형님들과 같이 나오셔서 “정희 오느냐!” “정희야!”하고 부르시면 “여기 가요!”하고 대답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왜 좀 일찍 오지 이렇게 늦느냐!”하며 걱정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자기가 두르고 온 목도리를 나에게 또 둘러 주신다. 뛰어왔기 때문에 땀이 나서 춥지도 않은데 어머니가 자꾸만 목에다 둘러주시는 것이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구들목 이불 밑에 나의 밥그릇을 따뜻하게 넣어 두었다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어머니는 상머리에 앉아서 지켜보신다. 신고 온 버선을 벗어보면 흙투성이다. 어머니는 밤에 버선을 빨아서 구들목 이불 밑에 넣어서 말린다. 내일 아침에 또 신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얼었다가 저녁을 먹고 온돌방에 앉으면 갑자기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숙제를 하다가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들어버린다. 어머니가 억지로 나를 깨워서 소변을 보게 하고 옷을 벗겨서 그대로 재우면 곤드레가 되어 떨어져 자 버린다.
체구가 작은 이유
나의 나이 9세에서 15세까지 6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다. 학교에 가지고 간 도시락이 겨울에는 얼어서 찬밥을 먹으면 나는 흔히 체해서 가끔 음식을 토하기도 하고, 체하면 때로는 아침밥을 먹지 않고 가기도 하였다. 이럴 때는 하루 종일 어머니는 걱정을 하신다. 그러나 그 당시 시골에는 소화제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면 이웃집에 침쟁이 할아버지가 있었다. 거기에 가서 침을 맞았다. 이상하게도 그 침을 맞으면 체증이 낫는 것 같았다. 나의 왼손 엄지손가락 뿌리에는 지금도 침을 맞은 자국이 남아서 빨갛게 반점이 남아 있다. 이 반점을 보면 지금도 어머니 생각과 이웃집 침쟁이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우리 형제들이 다들 체구가 건강하고 신장도 큰 편인데 나만이 가장 체구가 작은 것은 이 보통학교 시절에 원거리 통학으로 신체발육에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없이 평화스럽지만 가난한 나의 고향, 가끔 학교에 가져가야 할 용돈이 필요하면 어머니가 한 푼 두 푼 모아두신 1전짜리 동전, 5전, 10전까지 주화를 궤짝 구석에서 찾아내어 나에게 주신다. 한 달에 月謝金(월사금)이 그 당시 돈으로 60전이었다. 매월 이것을 납부하는 것이 농촌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특히 우리 집 형편으로는 큰 부담이었다. 어머니께서는 한 푼이라도 생기면 나의 학비를 위해서 모아두신다. 때로는 쌀을 몇 되씩 팔아서 모아두신다. 계란 1개가 1전이었다고 기억이 난다. 계란도 팔면 모아주신다. 형들이 달라면 없다하시고 알뜰히 모아두신다.
어머니는 담배를 좋아하셨다. 때로 담배가 떨어져도 나의 학비를 위해 모아두신 돈을 쓰실 생각은 아예 안하신다. 때로는 학교에 가져가야 할 돈이 없으면 계란을 떨어진 양말짝에 몇 개 싸서 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학교 앞 문방구점에 가면 일본인 상점 주인이 계란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고 상한 것 같지 않으면 1개 1전씩 값을 쳐서 연필이나 공책과 교환하여 준다. 이 계란을 들고 가다가 비 온 날이나 땅이 얼어서 빙판이 된 날 같은 때는 미끄러져 넘어지면 계란이 파삭 깨어져 버린다. 이런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 계란 깨었다는 꾸지람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딱하지! 넘어져서 다치지나 않았느냐”하고 걱정하실 뿐이다.
비름나물에 얽힌 추억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보통학교 2~3학년 시절이라고 기억이 난다. 20리 시골길을 왕복하니 배도 고프고 봄날이라 노곤하기 그지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정오가 훨씬 넘었다. 삽짝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혼자 커다란 바가지에 나물밥을 비벼서 드시다가 “이제 오느냐! 배가 얼마나 고프겠느냐”하시며 부엌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기에 부엌에 책보를 든 채 들어가 보니, 어머니께서는 바가지에 비름나물을 비벼서 막 드시려다가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같이 먹지 않겠느냐 하시기에 같이 먹었다. 점심 때가 훨씬 넘었으니 시장도 하지만 보리가 절반이상 섞인 밥에 비름나물과 참기름을 놓고 비빈 맛은 잊을 수 없는 별미다. 나는 요즈음도 가끔 內子(내자)에게 부탁하여 비름나물을 사다가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보곤 한다.
엄동의 추운 겨울에는 저녁을 먹고 나면 가족들이 한 방에 모인다. 세상사 여러 가지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아버지와 형들이 한 방에 모여 있으니 아버지가 계신고로 형들은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눈치를 알아차리시고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내려가신다. 형들에게 담배를 마음대로 피우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셈이다. 밤이 늦어지면 이야기도 한물가고 모두들 밤참 생각이 난다. 어머니께서 홍시나 곶감을 내어놓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저녁에 먹다 남은 밥에다가 지하에 묻어둔 배추김치를 가져와서 김치를 손으로 찢어서 밥에 걸쳐서 먹기도 한다. 이것이 시골 농촌의 겨울밤의 간식이다. 가끔은 묵을 내는 때도 있다.
外家 식구들
칠곡군 약목에 계시는 외삼촌이 가끔 오신다. 어머니의 바로아래 남동생이다. 한학자이며 약목에서 서당을 차려놓고 동리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다. 아버지와는 처남매부 간이라 유달리 다정하면서도 두 분이 다 고집이 센 분이라 옛날 이야기 하다가 때로는 서로 언쟁을 할 때도 있다. 어릴 때 이것을 옆에서 본 나는, 저렇게 연세가 많고 점잖은 분들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고집을 피우는가 하고 우습기도 하고 따분할 때도 있다. 외삼촌은 나를 무척 사랑해주시고 귀여워해주셨다.
수원 백씨, 문벌도 좋고 漢學(한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나 우리나라 봉건시대의 전형적인 유림이라 성미가 퍽 깐깐한 분이었다. 성명은 백남조. 과거에는 가세도 넉넉한 편이었으나 말년에는 이래저래 소유 토지도 대부분 처분하고 퍽 곤란한 편이었다고 기억된다. 외숙모도 퍽 다정한 분이었고, 어머니와 가끔 외가에 가면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답게 해주신 분이었다.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외삼촌, 외숙모 다 타계하시고 한 분도 생존해 계시지 않으니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 생각나는대로 편집자주: 유년시절 일화에 대해 박정희가 쓴 글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다. 맞춤법과 다른 부분은 괄호 안에 별도로 표기하였으며, 판독이 어려운 부분은 괄호로 남겨두었다. 相熙(상희) 형님이 妻家(처가)인 金泉(김천)을 가면서 나를 다리고(데리고) 갔다. 山골에서 자라서 촌띠기기 때문에 金泉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형님의 善心이었다고 본다. 兄님의 妻宅은 金泉市 黃金町이었다. 하루는 兄님과 같이 市內를 거러가는데(걸어가는데) 아이스크림 장사가 있어 兄님이 그것을 사먹으라고 돈을 주었다. 고깔같이 생긴 ( )에 아이스크림을 담어(담아) 주는 것을 조고마한(조그마한) 美製 스픈(스푼)으로 먹었다. 生전 처음 먹어보는 아이스크림 맛이다. 먹다가 보니 형님은 작구만(자꾸만) 거러가고(걸어가고) 있었다. 빨리 먹고 兄님을 따라 갈려고 빨리 빨리 먹다가 아이스크림 ( )가 깨어졌다. 나는 먹고 그릇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줄만 알고 있었기에 깜짝 놀라 저-기 거러가고(걸어가고) 있는 兄님을 “兄님”하고 큰소리로 불렀다. “兄님 이것이 깨어졌어요. 물어주어야겠어요”하고 울상을 하고 당황하고 있으니 아이스크림 주인이 “그 그릇도 같이 먹는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기에 그때야 아이스크림을 든 채 형님을 쪼차(쫓아) 따라갔다. 그날 저녁에 兄님과 兄수씨가 “촌놈”이라고 놀려주었다. 이 일은 그 뒤에도 촌뚜기(촌뜨기) 노릇을 했다고 놀림을 받았다. 普通學校(보통학교)에 入校(입교)하기 前이었다. 어느 겨울 若木(약목) 外家宅(외가댁) 祭祀(제사)에 아버지·어머니를 따라서 갔다. 도라(돌아) 오는 날은 엇떻게(어떻게) 되었는지 저녁을 먹고 若木福星洞(약목 복성동)을 떠나서 上毛(注: 구미면 상모리, 박정희의 출생지)로 도라(돌아)왔다. 若木서 北三面(북삼면)을 지나오는 글 걸판(注: 川邊)을 지나올 때 눈과 바람이 몹시부러(불어) 앞이 보이지 않을 程度(정도)로 눈보라가 휘모라(휘몰아)쳤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등에 번가라(번갈아) 가면서 엎여서왔다. 나는 엎인 체 어머니 등에서 잠이 들어서 집에까지 왔다. 上毛里 집에 왔을 때는 밤이 깊었다. 途中(도중)에 時間(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잠이 들어서 알 수 없으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어릴 때였지만 늘 생각이 난다. 지금도 京釜線(경부선) 鐵道(철도)로 若木(약목) 附近(부근)을 지나면서 그 곳을 보면 그때의 생각이 나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옛 追憶(추억)에 잠기면서 지나곤 한다.
金鐘信의 서신에 肉筆로 답한 朴 대통령 ▲ 아버님의 성격 쾌활하고 호담하였으며 두주불사(斗酒不辭). 소시에 성주(星州)어느 산길을 밤에 혼자 지나다 범을 만나서 길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부싯돌을 치니 섬광이 튀자 범이 사라지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 담대하였다고 느껴진다. ▲ 농사짓던 생각 거름을 지고 다닌 기억은 없고 추수시 볏단을 지게에 지고 운반한 일은 여러번 있었다. 작은 지게에 한짐 잔뜩지고 집에 와서 마당에 부리니 큰형님인가(?) 누가 정희도 이제 밥값 하는구나 하고 농하던 생각이 회상된다. ▲ 농촌 사람들의 술과 도박 우리 집에서도 자주 密酒(밀주)를 해 먹었음. 동네 어귀에 밀주를 조사하러 경찰이 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구들목에 이불로 싸둔 술독을 이불에 싼채 들고 뒷산으로 가져가서 숨기던 일이 여러 번 있었음. 노름은 花套(화투)놀이가 성행한 것으로 기억된다. ▲ 급장시절의 추억 힘이 세고 말을 잘 들어먹지 않는 급우가 한 놈 있었음. 그러나 이자가 수학은 전연 못하고 늘 선생님에게 꾸지람 듣는 것을 보고 그 자를 내 말을 잘 듣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휴식시간에 산술문제를 가르쳐 주고 숙제 못해온 것을 휴식시간에 몇 번 가르쳐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이라면 무조건 굴복하던 생각이 회상됨. ▲ 어리석었던 일 학교에서 하학길에 콩서리해 먹고 콩밭 주인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일˙˙,그 다음 수일 동안은 그 밭 주인이 무서워서 학교 가는 길을 다른 길로 피하여 다니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 군인이 되었으면 소년시절에는 군인을 무척 동경했다. 그 시절 대구에 있던 일본군 보병 제80연대가 가끔 구미지방에 와서 야외훈련하는 것을 구경하고는 군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渴望했음.
아이스크림
國民學校(국민학교) 3學年(학년) 夏季放學(하계방학) 때였다.
눈보라치는 겨울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