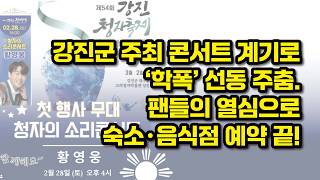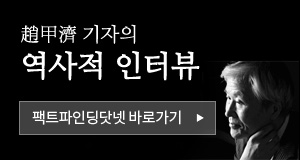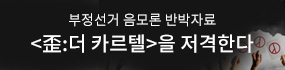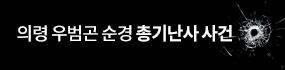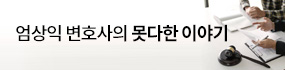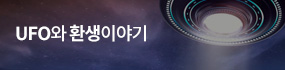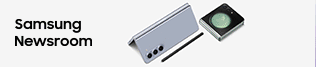매년 11월11일 오전 11시 싸이렌이 울리고 6·25참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참전 용사들은 부산을 향해 1분 간 묵념한다. ‘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란 행사의 일환이다. 6·25남침전쟁에 맞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戰死)한 참전국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행사이다.
이 행사는 2007년 캐나다 출신으로 6·25참전용사인 빈스 커트니 씨가 ‘6·25전쟁 참전했던 유엔 참전국 희생 장병들이 안장된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1월11일 오전 11시(한국 시각) 1분 간 묵념과 추모행사를 열자’고 제안해 성사되었다.
2014년 11월11일 부산에선 ‘유엔평화기념관’도 개관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희생과 정신이 세계평화를 꿈꾸는 씨앗이 되다’란 주제로 건립되었다. 유엔이 보여준 희생과 봉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대한민국 정부가 260억 원을 투자해 세운 것이다. 부지 6810㎡, 연면적 7999㎡,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이다. 3개 상설전시관과 4D 영상관, 다목적컨벤션홀,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6·25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은인(恩人)이 한 명 있다. 바로 초대 美8군 사령관인 워커(Walton. H. Walker 1889~1950) 장군이다. 워커 장군은 6·25가 발발한 직후인 7월7일, 일본 도쿄에서 대전으로 와 13일 美8군 초대 사령관으로 부임, 작전을 지휘했다.
워커 장군은 백척간두에 처한 대한민국의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美軍 병사들에게도 ‘우리는 절대 물러 설 수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 낙동강 방어선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는 없다’면서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Stand or Die)’를 외쳤다. 임전무퇴의 軍人정신을 천명한 것이다.
워커 장군은 전황(戰況)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고, 결정 역시 단호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워커 장군은 일선 부대를 자주 방문,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힘썼다. 지휘관이 병사와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병사들은 용기백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워커 장군은 1950년 9월6일 美8군사령부를 대구에서 부산수산대학(現 국립 부경대학교)로 옮겨 도쿄의 맥아더 장군과 통신을 통해 작전계획을 협의했다. 전쟁으로 인해 대학 건물은 美軍과 스웨덴 야전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워커 장군이 美軍사령부를 부산수산대학으로 옮긴 이유는 한국전쟁 역사서인 《U.S. Army in the Korean War》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작전用인 텔레타이프 통신장비의 교신내용이 敵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부경대학교 캠퍼스 종합강의동 동쪽에는 워커장군이 당시 집무실로 사용했던 두꺼운 돌벽으로 된 방호건물형 돌담집(높이 6.45m, 면적 308㎡) 이 있다. 대학 측은 이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Walker House’로 명명하고 워커 장군의 위업을 기리고 있다.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戰勢)가 호전됨에 따라 워커 장군의 휘하 부대도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했다. 美8군사령부는 그해 9월24일 다시 대구로 이동했고, 워커 장군도 부산을 떠났다. 그가 이곳에서 머무른 기간은 불과 18일 정도였지만 이곳은 대한민국 사수(死守)의 최후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의 지휘본부 역할을 했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며 반격의 물꼬를 터 준 역사의 현장이었다.
워커장군은 같은 해 12월23일 美24사단 중대장으로 복무 중인 아들 샘 심스 대위에게 은성무공훈장을 직접 달아 주기 위해 식장(式場)으로 가던 중 의정부 축성령 고갯길에서 한국군 차량과 충돌, 순직했다. 38년 간의 軍생활을 한국 전선에서 마감한 것이다.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준 전쟁 영웅 워커 장군. 그분의 유적이 부산에 남아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몇 사람이나 알고 있을까? 자유와 평화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워커 장군이 수호하고자 했던 평화, 자유의 소중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