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에 경북 영주(榮州)에서 있었던 '한국선비문화축제'를 돌아보고 왔다. 수많은 축제 가운데 '한국선비축제'에 참가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축제 가운데 영주에서 개최되는 '한국선비문화 축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이 어지러운 세상(亂世)에 '선비문화와 선비정신'을 일깨우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영주인(榮州人)들의 숭고한 정신에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죽령(竹嶺)고개에 오르자 '선비의 고장 영주'임을 알리는 이정표(里程標)가 길안내를 해줬다.
민족의 진산(眞山) 소백산(小白山) 자락에 포근히 내려 앉은 영주골에는 산새가 울어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산철죽이 만발(滿發)하고 산천초목이 푸른 기운을 발산(發散)하는 풍경 이 '영주'라는 지명(地名)그대로 줄기차게 달려가는 번영의 '푸른산맥' 그 자체처럼 보였다. 화창한 봄기운, 싱그러운 산들바람,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영주사람'들의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자세가 산하(山河)에 가득해 보였다. '한국선비문화축제'는 순흥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서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체험과 축하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선비정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며 즐겁게 선비정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비의 고장'임을 자랑으로 내세우기를 바랐지만 영주(榮州)가 유일하게 '선비의 고장 영주'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다.
'영주'는 문화유적으로 보면 낙동강 상류문화권의 중심지요, 유교와 불교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유불성지(儒佛聖地)'로 불린다. 조선왕조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이 있고 신라천년고찰(古刹) '부석사(浮石寺)'가 대표적이다. 추로지향(鄒魯之鄕)임을 자부하며 선비와 양반문화의 덩다락같은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인근 안동(安東)도 '선비의 고장'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세계 정신문화의 수도(首都)'임을 내세우고 있다. 1998년 영주시(榮州市)가 특허청에 '선비의 고장 영주'라는 상표등록을 선점하고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고 때문이다. 영주에 한 발 늦은 안동의 느긋함이 화근이었다. 영주시는 이어 선비의 고장 표장으로 '선비림', '백년선비' '나눔선비', '시민선비', '선비록', '선비동경', '안자육훈' 등 일곱 개 표장도 상표도 등록했다.
영주인들은 조선조 중종(1543년) 때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국내 주자학의 길을 연 고려시대 안향(安珦)선생을 배향(配享)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소수서원'으로 사액서원이 되어 퇴계 이황 선생 등 수많은 거유(巨儒) 대학(大學)들을 배출한 세계 역사상 최고 교육기관임을 자랑하고 있다. 불교도 소백산 희방사(喜方寺)는 훈민정음 한글판본인 '월인석보'를 소장한 사찰로도 유명하다. '월인석보'는 석가세존의 일대기를 엮은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판한 것이다. 이밖에도 흑석사, 초암사, 진월사, 성혈사 등 많은 사찰들이 있다. 신라와 고구려 국경지대였음을 추정케 하는 순흥 고구려 고분벽화 등도 있다.
또 영주인들은 1457년 순흥도호부사 이보흠(李甫欽)이 유배중인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의기투합하여 단종복위 운동을 벌이다가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한 충절(忠節)의 정신도 기리고 있다. 이보흠의 단종복위 운동은 금성궁 시녀 김련과 관노(官奴)가 보관 중이던 격문(激文)을 빼내 밀고(密告)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가고 관여했던 수많은 인사들이 참수당해 흘린 피가 멀리 흘러가다 그쳤다 하여 '피끝마을'이란 동네 이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보흠의 단종복위운동 실패로 순흥도호부는 폐부(廢府)되고 마는 역사의 불운을 남겼지만 백성들의 단심(丹心)만은 길이길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었다.
'한국선비문화 축제'에서 보여준 '선비문화와 선비정신'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축제에 동행했던 유학자(儒學者) K선생은 '단재 신채호(丹齊 申采浩)’ 선생의 강론(講論)을 소개해 줬다. '인격(人格)과 학문, 경세제민'을 설명했다. 인격도야는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언행을 자제하며 예를 갖추어 인간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학문(學文)연마는 깊고 넓은 학문을 닦아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도리를 터득하고 고금(古今)변화를 통해 사리(事理)에 통달(通達)하는 것이다. 경륜(經倫)은 인류문화에 대해 창조적 충동을 느껴 자기의 소임으로 삼아 포부와 경륜을 품고 실지로 천하대세를 맡을 경우 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 근본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3일간의 한국 선비문화 축제를 뒤로 하고 예천(醴泉)에 들려 맛있는 청포묵밥 한 그릇으로 요기(療飢)를 하고 문경새재를 넘어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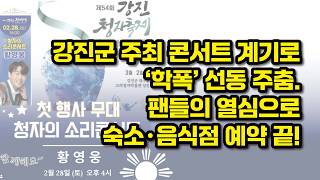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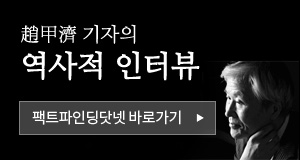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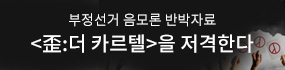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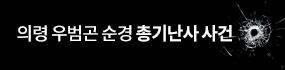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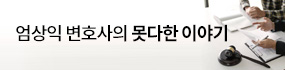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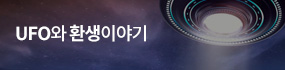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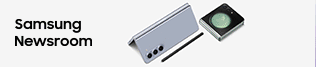
다른 분들은 차치하고 우리가 존경해 마지않는 이황, 이이 두 분도 큰 대학자시며 經世濟民 하신 대선비시다.
선비, 선비정신은 우리의 빛나는 세계적 문화유산이며 자랑이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셔서 휠링하셨다는 느낌이 오는 글입니다.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고 인근에 위치한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각기 자기 고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주와 안동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조선조의 선비, 양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역사 인식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정년퇴임하신 이영훈 교수에 따르면 조선은 선비,양반이 노비를 지배하는 거의 노예제 수준의 국가 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존경해 마지 않는 세종대왕때 부터 노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많을 때는 조선 인구의 40%까지 노비였다고 합니다.이렇게 선비,양반을 위해 자기 백성의 40%까지를 노비로 만든 법을 제정한 세종대왕은 선비,양반의 성군이지 전 조선백성의 성군은 결코 아니였다고 이영훈 교수는 주장합니다.노비는 상속,증여가 가능한 재산이였습니다.선비나 양반은 노비를 마당쇠(마당에 있는 소),개똥이,바우(바위)등으로 부르며 인간이 아니라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즉 물상으로 여겼습니다.심지어 양반이 노비를 죽여도 아무런 죄과를 치르지 않았던 사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조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영주,안동 지방에는 사농공상,남존여비
사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도 영주 출신이고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도 영주와 안동을 모두 사랑하지만 지나치게 선비,양반을 강조하고 지방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선비는 영주에서만 있은 가 배
영주선비는 말카 장사꾼이었고
상표등록도 하고 특허도 냈으니 돈벌이 잘 되겠고
돈벌어 삼겹살에 소주 사묵으마 좋겠구나
영주시장 이것이 똘아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