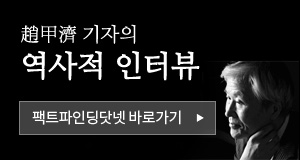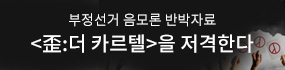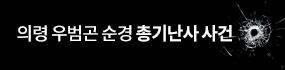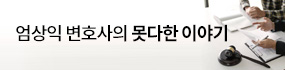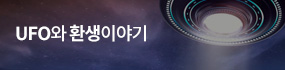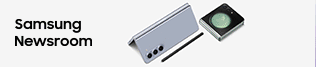이곳을 드나든 지도 오늘로써 30년. 그냥 좋다. 마냥 즐겁다.
매일의 일상이 무미건조하고 새로운 변화와 내면의 충전을 위하여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경북 김천시) 부항면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대야리에 시골집을 수리하여 제2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삼도봉 1번지'라 명하고 어김 없이 주말이면 찾아간다.
하기야 딱히 촌(村)이라고 부르기엔 어울리지 않지만 나는 이곳을 삼도봉 1번지라고 부른다. 원래 지명은 천지동(天地洞)이었는데 나라에서 임금이 살지 않는 곳의 이름을 천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여 ‘하늘 천(天)’자에서 ‘한 일(一)’을 빼 ‘큰 대(大)’자로 고치고 ‘땅 지(地)’자에서 ‘흙 토(土)’자를 빼 ‘어조사 야(也)’자로 고쳐 대야(大也)라 하였다.
우리 어릴 땐 얼마나 오지였나 하면 그냥 부항이라고 하지 않고 꼭 뒤에 부항 골짜기라고 이름하여 불렀다. 비포장에 하루 두 번 오가는 시골버스, 또 웃기는 지명 '안간리'라고 있다. 여기는 택시도 안간다는 '안간리'란 동네다.
경상 충청 전라(慶尙 忠淸 全羅) 삼도(三道)가 접해있는 봉오리 해발 1412m가 바로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아랫마을이라 나는 그곳을 '삼도봉 첫 동네'라고 부른다.
매년 10월 10일이면 삼도봉 정상에서 삼도(三道) 주민이 만나 화합을 다지는 삼도봉(三道峯)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한때는 광산(금광)의 개발로 인하여 100여 가구가 훨씬 넘는 가구가 살았지만 지금은 20여 가구가 사이좋게 살고 있는 양지바르고 인심 좋은 동네다.
삼도봉(三道峯) 자락에서 흐르는 푸른 물과 맑은 바람은 철 따라 계절의 맛을 느낄 수 있지만 난 그곳의 겨울이 좋다. 가마솥 정지 장작 통시 차가운 밤하늘의 별들 이름만 불러도, 들어도 정겨운 단어들이다.
이제는 마을 입구까지 포장되고 물 좋은 골짜기마다 펜션이 들어서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이곳을 꼭 촌(村)이라고 부르고 싶다. 뒷집 할머니는 6·25에 남편을 여의시고 하나 있는 자식은 도시로 나가고 혼자 사신다.
투박한 손과 주름진 얼굴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해 내고 싶다. 동네 처음 왔을 때는 동네 텃세를 받았지만 이내 친해 동네 이장과 장기를 많이 뒀다. 촌 장기라 나보다 훨씬 윗수였다.
처음에는 상(象)을 빼고 뒀지만, 지금은 말(馬)을 떼도 내가 진다. 먹을 게 있으면 서로 불러 나누고 한다. 인심 인심해도 그래도 시골 인심이다. 우리 부부는 매 주말마다 간다. 여름에 가면 우선 마당에 풀을 정리해야 한다.
돌아서면 풀이 자라 그것도 일 중에 큰일이다. 제초제나 풀 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전부 정리한다. 흠뻑 젖은 땀은 작두샘 물에 목욕을 하면 날아갈 기분이다.
가끔 뒷집 할머니는 국시를 얼마나 잘 미시는지 누른 밀가루에 호박 썰어 멸치국물을 풀어 먹고 마루에 사리마다만 입고 낮잠을 자고 나면 어느 누가 부러우랴. 여름이라고 하지만 방바닥이 눅어 군불을 조금은 넣어야 한다. 해발이 높아 모기는 없지만 저녁에는 이불을 덮지 않고는 추워서 못 잔다.
초저녁부터 울담 밑에 귀뚜라미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의 합창 소리, 어미를 부르는 고라니 소리, 알 수 없는 동물의 소리와 시내와 달리 밤하늘 별들의 향연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게 맛을 알아”라는 광고로 대신 하고 싶다.
여름도 그렇지만 겨울이면 어떤가. 순서는 언제나 마찬가지다. 먼저 정지문의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부엌 아궁이에 불쏘시개를 넣으면 나오는 매케한 연기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살아 있음을 체감한다.
두꺼운 가마솥을 열고 얼어있는 작두샘에 한 주전자의 뜨거운 마중물을 넣고 잦으면 오래지 않아 차가운 지하수가 올라온다. 세 바케츠의 물을 받아 솥에 붓는다. 뒷담에서 장작을 한 아름 가져와 그때부터 군불을 지핀다. 불구멍에서 붉은 열을 토해낼 땐 얼굴이 붉어지고 아랫도리가 뜨끈뜨끈해진다. 그때 방을 향하여 부른다.
“여보 이리와 여기 한번 앉아봐. 올 때 도장에서 고구마 좀 가져와.”
불이 사그라들며 숯이 될 때 은박지로 싼 고구마를 올리면 우리가 말하는 야키이모가 된다(야키이모는 일본식의 구운 고구마). 손이 뜨거워 호호 불며 껍질을 벗기고 먹는 맛은 롯데리아 햄버거에 비할 수 있으랴.
친구들 올 때는 소 마구간을 고쳐 통유리를 넣고 만든 전망이 좋은 방을 빌려준다. 우리야 시골이 좋아 오지만 친구들은 왜 오는지 아파트 생활의 무료함에서 시골 냄새를 맡으러 오는 것 같다. 이 방 저 방 군불을 지피고 나면 집 앞에 차 소리가 들린다.
두 손에 가득 먹을 것을 들고 온다. 아궁이에서 꺼낸 숯불 위에 지글지글 끊는 돼지고기에 겨울 상추를 싸 먹으며 밤 늦도록 이야기를 하곤 한다. 방을 나와 밤하늘을 본다. 별빛이 아니라 별바다다. 별이 천지삐까리다. 차가운 하늘이 전부 내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어찌 이런 밤을 두고 잠을 청할 수 있을까?
북풍의 세찬 바람 소리지만 어떻게 내 마음은 이렇게 고요할까?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런 것을 무심(無心)이라고 하는가? 무아지경(無我之境)이라고 해야 하나?
겨울 이야기도 해보자. 아침이 되면 눈이 와 있다. 시내와 달리 이곳은 많은 눈이 온다. 눈은 마당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온다. 눈을 치우고 나면 어제저녁 가마솥에 데워둔 물로 세수를 한다. 여자들은 물이 좋아 스킨을 안 바르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가 좋다고 한다. TV도 라디오도 컴퓨터도 냉장고도 없다. 갈 때마다 책은 한 권씩 가지고 가서 꼭 읽고 오기로 한다.
아침 햇살이 퍼질 즈음엔 산에 간다. 계곡마다 얼음이 얼어 바위를 감싸고 있고 눈이 수북이 쌓여 있다. 나무 나무마다 눈꽃 봉우리가 맺혀서 꽃얼음이 될라. 웅굴 둔지에 가면 가끔은 고라니들이 먹을 것이 없어 동네까지 내려와 기웃거린다.
바람이 귓가를 찢는다. 올라 올 때 비료 포대를 하나씩 가지고 온다. 동네 뒤 언덕은 우리의 썰매장이다. 몇 번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등에서는 김이 서린다. 이곳에 며칠씩 묵다 간 지인들도 많다.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작곡한 찬양 사역자 최용덕 간사도 한 달 살고 떠나며 여기가 바로 하늘 밑 '삼도봉 첫 동네'라고 하였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아저씨 아줌씨, 초지녀게 참나무 장작 패가꼬 가마솥에 군불 때고 아랫목에 지지다가 새벽게 요대기 미태 발가벗고 누엇따가 일어나는 요 기분 요 재미 아파트 사는 아줌씨들 우째 알끼가?
벌써 이곳을 드나든 지도 오늘로써 30년이 된다.
그냥 좋다.
마냥 즐겁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부른다.
삼도봉(三道峯) 1번지
- 浩然의生覺(회원)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4-08-28, 10:05